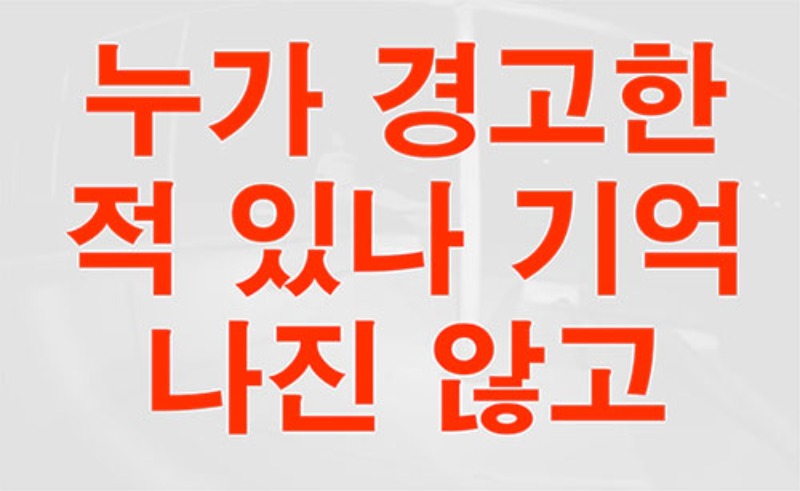인간, 일곱 개의 질문

확장되어가는 인간을 둘러싼 철학적 시선
리움미술관의 재개관 소식은 미술계에 탈 코로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고전 명작과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을 주로 전시했던 미술관은 재개관전으로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라는 다분히 거대한, 동시에 보편적인 주제를 택했다. 세계는 변하고 그 속도는 최근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빠르고 복잡하다. 그러나 그 안의 ‘주체’는 타자와 또 세계와의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선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인간의 중심에 놓인 욕망 때문일 것이다. 이번 전시는 그래서 변화와 불변을 상징하는 키워드 간의 팽팽한 긴장의 중심에 인간이라는 영원한 질문을 놓고 탐구하는 일종의 철학적 관찰과도 같은 것이었다. 리움미술관은 인간에 관한 바로 질문을 소주제처럼 나누어 전시를 구성했는데, 일곱 키워드는 ‘거울보기’, ‘펼쳐진 몸’, ‘일그러진 몸’, ‘다치기 쉬운 우리’, ‘모두의 방’, ‘초월 열망’, ‘낯선 공생’이다.
‘거울보기’는 주체의 첫 형성 단계라고 논의되는 자크 라캉(Jaques Lacan)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나와 타자와의 거리가 부재하거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와의 동일성을 발견함으로써 주체와 욕망이 함께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인물을 다룬 대표적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 조지 시걸(George Segal) 등 유명 조각가들의 인체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전시의 대문 역할을 하고 앤디 워홀(Andy Warhol), 쉬린 네샤트(Shirin Neshat), 론 뮤익(Ron Mueck) 등의 다양한 인간 묘사가 이어진다. 주명덕과 육명심이 한국의 유명 예술가들을 찍은 작은 크기의 사진은 그들에게 끌리는 ‘내’ 안의 동질성을 발견하게 한다. 예술에 대한 존중이 미술관의 존재 이유이듯, 유명인들의 아카이브 같은 초상 사진은 거울보기를 통해 관람객 모두가 예술의 유전자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전시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김상길
<오프라인_알라스칸 말라뮤트 인터넷 동호회>
2005 C-프린트 144×181cm © Kim Sang-gil
‘펼쳐진 몸’은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아무 제한 없이 드러나는 몸을 다루는 작품들의 구성에서 그렇고,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 관념론적 철학의 반대항으로서의 몸을 제시한다는 의도에서도 그렇다. 즉물적이고도 반권위적 태도로 수렴되는 여성 작가의 벗은 몸과 퍼포먼스가 눈에 띄지만 이들과 반대축에 서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이브 클렝(Yves Klein)의 <인체 측정>이나 조상, 가족의 전통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장 후안(Zhang Huan)의 <가계도> 같은 작품들은 여전한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를 대변하는 작품들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일그러진 몸’은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가해진 폭력과 악한 관습에 의해 흉터 난 흔적이나 인간 내면의 심리적 상처들을 다룬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이나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들이 제2의 성으로서 여성의 역사를 부서지고 파편화된 신체로 함축한다면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카데르 아티아(Kader Attia), 류인 등은 고통을 담은 신체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로버트 롱고(Robert Longo)의 <이 좀비들아: 신 앞의 진실>은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흔적으로서의 몸이 아닌, 저속하고 이질적인 결합의 시각화이지만 키치적 상상력으로 고조된 전투적인 몸을 보여주어 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염지혜 <에이아이 옥토퍼스> 2020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35초
© Yeom Ji Hye
‘다치기 쉬운 우리’는 취약한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변형을 다룬다. 절대적 몸의 문제에서 타자와의 차이에 대한 감정과 심리 상태로 주제가 옮겨왔다. 김옥선은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감도는 긴장과 거리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성을 다국적 커플의 사진에 담아냈다. 정체성을 질문하는 니키 리의 ‘프로젝트’ 연작이나 인간 욕망을 과장되게 보여주는 김인숙의 <토요일 밤>, 실제 만남보다는 가상의 공간이 편한 인터넷 공동체를 담은 김상길의 ‘오프라인’ 시리즈 등은 사람들에 관한 흥미롭고도 미묘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며 스펙터클과 반-스펙터클 경향의 두 축을 왕래한다. 결국 타자를 욕망하는 주체 안의 분열은 인간의 영원한 주제가 될 것이다.
‘모두의 방’은 고정된 생물학적 성에 반기를 들고 차이의 문제가 평등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LGBT 작가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화 안에서의 신체의 의미와 기호의 역할을 살펴보거나, 고정된 성 개념에 수반된 가치들을 질문하고 해체하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초월 열망’은 결합과 변형을 통한 신체의 이질적 체계를 다루는 작품들로 이불, 백남준, 이형구, 정금형, 매튜 바니(Matthew Barney), 스텔락(Stelarc)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초월이란 단어가 오해를 주는데, 물질이나 가시적 세계 너머가 아닌, 신체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탈-물질이기 보다는 물질을 비롯한 타 존재들과의 접합을 지향하는 인간의 특이하고도 강렬한 추구가 문학적 상상력을 포함, 탈현실적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4 싱글채널 비디오, HD, 컬러, 사운드, 카펫,
프린트된 이미지, 화분 22분 37초 © Cécile B. Evans
‘낯선 공생’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반가운 섹션이었다. 최근 과학과 시사적 문제들을 반영한 작품들로, 매체로서의 뉴미디어, 과학 기술, 미래에 관한 신개념에 기초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환경, 자연, 동물부터 가상의 존재까지, 인간중심의 사회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 제기되면서 탈-인간중심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가시화한다고 할 수 있다. 세실 B. 에반스(Cécile B. Evans)의 <하이퍼링크가 없으면 무효>는 디지털 가상 캐릭터들을 다룬다. 특정 인물의 아바타부터 완전히 가상적 이미지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낯설지 않음을 보여준다. 호 추 니엔(Ho Tzu Nyen)의 <노 맨 II>는 유인원, 공룡부터 유전자 돌연변이, 좀비, 사이보그까지 실제 존재했던 것과 완전한 가상의 것까지 다양한 정체들 또는 유사 인간들이 섞인 동영상 작품을 제작했다. 과거의 인류부터 이질적 존재들로 확장되어가는 범-인류 이미지가 디지털 문화 안에서 가속화되고 있음을 재미있게 묘사했다. 생명공학과 공상과학을 접목하는 데이비드 알트메즈(David Altmejd)는 온라인의 텍스트들처럼 복제·반복되며 쉽게 왜곡되는 인체를 제작했다.
포탄처럼 정열된 수십 개의 담배를 지닌 손에 스핑크스의 부서진 코를 가진 인간, 무수한 눈으로 덮인 얼굴 등 기이하지만 온라인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변형의 구조를 기계적으로 얼굴에 적용시켰다. 괴기스럽지만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보여준 무의식의 자극이나 미학적 도전과 달리 기계적이고도 가볍다.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의 <이상의>는 인간의 순간적 생각, 상상을 fMRI로 스캔하여 얻어낸 수많은 마음 이미지들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화하고 인간-기계-환경이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한다는 의도를 갖는다. 즉 어떤 관념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들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이미지를 계속 생성하는 영상 작품이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와 오브제들, 동식물 등을 섞어 <환승역>을 제작한 막스 후퍼 슈나이더(Max Hooper Schneider)는 인간의 소비와 환경에 대한 냉정하면서도 매우 화려한 묵시록을 제작했다. 염지혜의 <에이아이 옥토퍼스>는 문어를 대안지능으로 제시하고, 김아영은 가상의 인물이 고대 근동의 신화의 근원을 탐사하면서 자연과 동물의 기운과 힘을 찾아간다는 설정의 영상 작품을 제작해서 탈-인간중심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역사와 결합했다.
주체, 성(gender), 몸, 환경, 과학, 일상, 욕망, 관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이번 전시의 일곱 질문은 인간과 미술의 접점을 제시하고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그 섬세한 노력을 잘 보여준다. 익숙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낮은 음성으로 출발한 전시는 점차 고조되면서 마지막 섹션에서 절정을 맞는다. 사회는 인간 존재의 보편성이나 고정된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문명을 통해 가변성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모더니즘의 온전하고 통합된 인간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 개방성의 일부는 기계문명, 디지털 온라인 습관과 융합되면서 대담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런 메시지를 극적인 서사나 정치적 구호 같은 직설적 개입 없이 담백하게 풀어내었으며, 오로지 관람객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긴다는 점에서 큰 미덕이 있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공간에 비해 섹션이 지나치게 많았고 몇몇 질문들은 통합되어도 무방해 보였다. 기존 소장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해서인지 키워드와 작품 간 관계가 애매한 경우도 가끔 있었다. 현대미술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낯익은 작품들의 배치도 메시지 전달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인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에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지만, 키워드 간에 범주의 유사함이나 철학적, 사회적, 역사적 관찰을 기초로 한 공통 전제들이 수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일곱 질문 간의 연결이 좀 더 드러났어도 좋았을 것이다. 가장 큰 아쉬움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첨예한 화두가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인간을 다루는 역사나 철학의 깊이를 보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전시는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풍성했지만, 너무 반듯해서 재미가 없었다.
언제나 질문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의 선택부터가 리움미술관의 색채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완성도를 향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과거의 리움과 일치하는 모습이라면 2021년 이후는 좀 더 과감한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도 무방할 듯하다. 전시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미술품의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도, 기획 의도가 흥미로운 도전적인 화두를 던지는 전시가 된다면 어떨까? 역사를 소중히 해왔던 미술관이 이제 주장을 담은 전시를 보여준다면 어떨까? 재개관을 맞은 리움미술관은 역사의 진중함과 무게로 고민하기보다는 가변적 범주와 미술에 대한 창의적 발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변모해 볼 기회를 맞았다. 그것이 진정한 재개관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호 추 니엔(Ho Tzu Nyen) <노 맨 Ⅱ> 2017 싱글채널 비디오, 서라운드 사운드, 스파이 거울 360분 가변 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Edouard Malingue Gallery and Galerie Michael Janssen © Ho Tzu Nyen
More Articles

Review
이원호_오만가지
Review
박찬욱_너의 표정
Review
FOMO(Fear of Missing Out)
Review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Review
2021 대구아트페어 올댓큐레이팅×아트경기
Review
송필_Beyond the Withered
Review
AES+F. 길잃은 혼종, 시대를 갈다
Review
변*태_시대를 탐하다 비끗하다
Review
KIAF SEOUL 2021
Review
최원준_하이라이프
Review
하-하-하 하우스
Review
몸이 선언이 될 때
Review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
Review
이광호_안티프래질
Review
김희수 NORMAL LIFE: Be Normal and People
Review
오연진, 허요 2인전 물질의 구름
Review
이혁발 몰랑몰랑 육감도
Review
현남_무지개의 밑동에 굴을 파다
Review
설탕과 소금
Review
김남두_허구와 실재의 공존
Review
강용운, 나를 춤추다
Review
비록 춤 일지라도
Review
로컬 프로젝트 2021: 박진명_잔상의 기록
Review
장입규_누가 우리 귀여운 코끼리의 코를 잘랐나.
Review
샌정_temporality
Review
친애하는 빅 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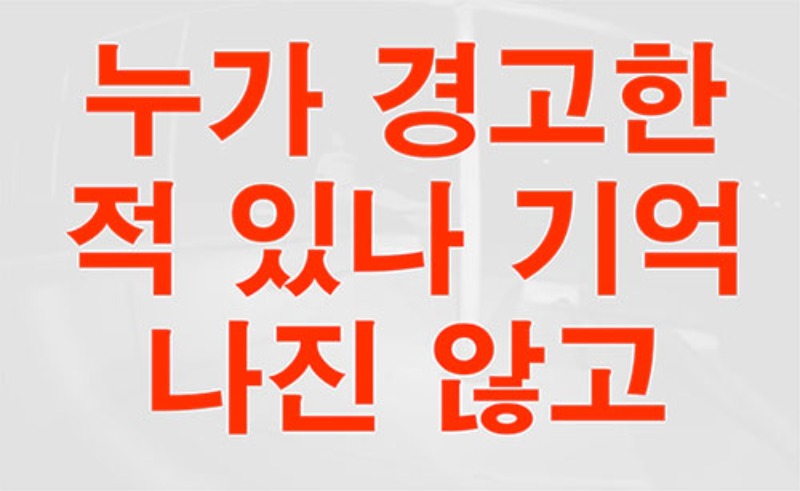
Review
노래하는 사람
Review
황재형: 회천回天
Review
이지현: ECSTASY, 감각하는 마리아